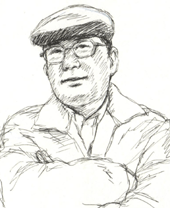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북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위의 글은 시가 아니고 산문이다. 만약 이 글을 처음 본 사람이 김기림 시집에서(또는 시 전집에서) 이 글을 찾으려고 했다면 분명히 실패하고 말았으리라. 필자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실은 이 글은 그의 유일한 산문집『바다와 육체』에 실린 글이다.
정지용의 시 「향수」라든지 정호승의 「이별노래」 같은 시를 노래로 부른 미성의 가수 이동원이 자주 이 글의 전문을 외워서 노래 부르는 사이사이 낭송하므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글이다. 역시 필자도 어떤 자리에선가 그 가수가 낭송하는 것을 듣고 아, 좋구나! 싶어 집으로 돌아와 책을 뒤적였으나 찾지 못한 기억이 있다.
김기림이란 시인은 정지용이나 이용악, 오장환, 백석과 같은 이름들과 함께 한동안 금기의 대상이었던 시인이다. 6·25전쟁 당시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월북한 것이 아니었나, 오해되어서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그 뒤에 해금이 되어 새삼 우리 곁으로 반갑게 돌아온 시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김기림이다.
김기림은 1930년대 우리나라의 시단에 서구의 시 이론을 배워다가 이식한 시인이면서 평론가로서 문학사에서 크게 기념할 만한 시인이다. 슈르-레알리즘이라든가 T. S. 엘리엇을 소개한 장본인이 바로 김기림, 그였기 때문이다. 뿐더러 시인은 자신의 시 이론에 따라 기발한 착상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시를 여러 편 창작하여 발표한 시인이기도 하다. 「기상도」,「태양의 풍속」 등이 그런 작품들이다.
위의 글 「길」은 스토리가 들어있는 글이다. 어머니의 상여가 꼬부라져 돌아간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이 첫 번째의 길이다. 그 다음은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린 첫사랑의 길이 두 번째 길이다.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북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던 길이 세 번째 길이다. 같은 길이지만 시간차를 두고서 다르게 반추되는 길의 이미지들이 차례로 전개된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소년은 여러 계절의 강물을 건너면서 그 길을 두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주된 경험이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는 것으로 집약되어 표현된다. 끝내는 ‘마을 밖 버드나무 밑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 기다림의 주요 대상들이다. 마지막 구절인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는 대목까지 읽게 되면 우리 자신도 시인과 함께 무엇인가를 기다리다가 끝내 오지를 않아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한 사람 소년으로 남게 됨을 문득 느끼게 된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감의 세계인가! 감동의 물결인가! 감동이란 결코 설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저 저쪽의 마음이 이쪽의 마음이 되어 함께 울리면 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한 설명 이전의 세계, 불합리한 이해의 세계이다. 마치 그것은 잘 울리는 두 개의 북처럼 한 쪽이 울릴 때 또 한 쪽의 북도 따라서 울리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그나저나 시인은 자신이 산문으로 쓴 글을 뒷사람들이 시로 바꾸어 읽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자신 서구 시 이론에 정통했을 뿐더러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었으므로 그래도 좋다, 하고 고개를 끄덕여 줄 것인가? 아니면 찡그린 얼굴로 못마땅해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