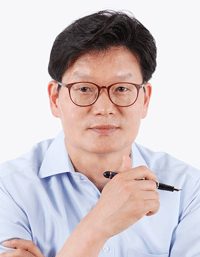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던 건물이 어느 날 없어진 것을 보면 순간 마음이 철렁한다.
자신에게 친근한 공간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것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환경은 그 자체로 내 삶의 일부요, 따라서 잘 가꾸어진 도시환경은 행복의 기본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겪어온 빠른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은 주거문제를 야기해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이 나라의 큰 난제로 등장한 적이 있었다.
1988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200만 호 아파트 건설’ 정책을 펴서 일산, 분당, 평촌 등의 베드타운형 신도시가 여러 곳 생겼다.
그 후 주택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이번에는 주거의 질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왕십리, 은평, 길음 등 34개 낙후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다.
이어진 서울지역의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선거는 ‘뉴타운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재개발 공약이 승패를 좌우했다.
하지만 오래 묵은 동네들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은 주거 약자가 아닌 강자들, 즉 대자본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로써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보육, 사회적 일자리 등 복지 담론이 중요한 투표기준으로 작용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매년 1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1년에 100개씩 노후한 구도심을 살 만한 곳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금의 시대 상황과도 부합한다. 한국경제는 어느 결에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이 소진되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나라경제와 사회 전반의 활력이 크게 둔화되었다. 말하자면 경제 호황기에 여유자금으로 시행하던 대단위 부동산 개발사업은 앞으로 힘들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시행된 재개발사업은 건물이 가장 낡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돈이 되는 곳, 이른바 사업성이 큰 순서로 추진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진 후 정작 사람들은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 소중한 추억은 지워졌고 동네는 해체되고 주민들은 갈등하고 분열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이었던가? 낙후지역을 재생시켰더니 임대료가 상승해 원주민과 초기에 상권을 개척한 점포가 쫓겨나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상징한다.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도시재생정책이 중시해야 할 것은 규모나 속도가 아니라 질적 수준과 완성도다. 재개발은 드넓은 땅에 큰 건물을 짓고 큰 길을 내는 일이라서 대자본과 대기업만이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을길을 고치고 살던 집을 리모델링하는 일은 동네기업과 개인 기술자도 할 수 있다. 가장 절실한 곳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게 도시재생의 단순한 철학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부수거나 낡았다고 허물지 말고 고쳐 써보자는 것이다. 서울의 북촌, 전주의 한옥마을이 잘 보여준다. 재개발의 제물이 되어 깎여나갔을 낡은 한옥들, 좁은 골목길과 마당을 고쳐 애틋한 추억을 담아 내놓자 적지 않은 지역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다.
서울역 고가를 공중정원으로 만든 ‘서울로7017’처럼 오래된 도시의 이야깃거리를 캐내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도 도시재생의 중요한 한 갈래다. 여기에는 도시는 오래 전에 태어나 앞으로도 장구하게 살아갈 생명체이며 건물과 자연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유기체라는 인문주의 정신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를 살고 싶은 공동체로 재생하는 일은 누가 주체가 되어 할 것인가? 주민, 행정, 그리고 전문가를 도시재생사업의 세 주체로 들 수 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행정의 속도주의와 성과주의가 작동하면 할수록 본래 취지와 엇가기 쉬운 게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임을 잊지 말자. 첫째가 시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