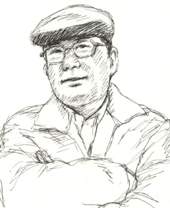
달 뜨걸랑 나는 가련다.
목숨 壽자 박힌 정한 그릇으로
체할라 버들잎 띄워 물 좀 먹고
달 뜨걸랑 나는 가련다.
삽살개 앞세우곤 좀 쓸쓸하다만
고운 밤에 딸그락 딸그락
달 뜨걸랑 나는 가련다.
이병철이란 이름은 재벌 회장의 이름으로는 모르지만 ‘시인’으로서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니다.
낯선 시인의 이름이요 숨겨진 시인의 이름이다. 한참 전이었을 것이다. 충남과 전북의 경계에 위치한 금산이란 산 높고 물 맑은 고장에 그 고장처럼이나 맑고도 깨끗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들을 만나러 자주 들락거리던 시절이었다.
주로 <좌도시>란 이름으로 시를 쓰는 안용산, 길일기 같은 시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또 시골 출신답지 않게 서울 시인들이며 장사익 같은 가인과도 교분이 있어 고은, 신경림 같은 거물급 시인들이 자주 오가고 있었다.
가운데 안용산이란 시인이 금산문화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장사익 가인이 와서 노래 부르면서 신경림 시인이 문학 강연을 한다는 기별이 있어 찾아가본 일이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신경림 시인이 암송으로 시 한편을 들려주었다. 처음 듣는 시였다. 신선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만년필과 메모지를 꺼내어 그 시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한 시절 교과서에도 나온 시라는데 느낌이 전혀 달랐다. 돌아와 책장을 뒤적여 해방 이후 교과서에 실린 시들을 모아놓은 책 한 권을 찾아보았다. 거기에 이 시가 나와 있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직껏 왜 이런 시를 모르고 살았던가? 아,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이병철(李秉哲)은 한동안은 한국시단에서 이름이 지워진 시인에 해당된다. 1918년 경북 영양 출생. 호는 풍림(風林). 1946년 시인 유진오와 김상훈 등과 함께 『전위시인집』을 편집.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여 활동.
기록에 의하면 ‘1949년 3월 당시 <농림신문> 기자이던 이용악의 지시로 「조가」,「전위의 노래」,「애국 인민의 노래」, 「숫자풀이」, 「장타령」 등 체제부정과 혁명을 선동하는 시를 지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1년 가까이 복역 중 북한군의 서울 점령 첫 날인 6월 28일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어 유엔군의 9.28 서울 수복 때 가족과 함께 월북한 시인’으로 되어 있다.
시인은 북으로 넘어가 '김일성 찬가' 같은 시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인이 바로 저 유명한 문둥이 시인 한하운을 문단에 소개시킨 장본인이라고 한다.
한하운 시인이 천형의 병 문둥병에 걸려 고향인 함경도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서울 거리를 방황할 때 그의 시 「전라도길」,「벌」과 같은 작품 12편을 받아 <신천지>란 잡지 1949년 4월호에 발표 하도록 하여 세상에 그 이름과 작품을 알렸다는 것이다.
위의 시는 매우 단순하고 깔끔한 시이다. 문장도 겨우 세 개뿐으로 단출하다. 단순구조라 할 것이다. ‘달 뜨걸랑 나는 가련다.’란 시행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시의 주인공은 낮도 아닌 밤, 그것도 달이 뜨는 밤에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떠나는 젊은이이다.
떠난다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갈구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에서 나온 구체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갈구와 그리움에 바쳐지는 시인의 노력이 또한 놀랍다.
머리를 감되 ‘은하 푸른 물’에 감는다 했고, 물을 먹되 ‘목숨壽자 박힌 정한 그릇으로/ 체할라 버들잎 띄워’ 먹는다 했으며, 길을 가되 ‘‘삽살개 앞세우곤 좀 쓸쓸하다만/ 고운 밤에 딸그락 딸그락’ 소리 내며 가자고 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럽도록 아름답던 세월이 있었던가! 이것은 한 폭의 마음의 풍경화요 소리 없는 교향악이다. 이 시에 나오는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차라리 신발 끄는 소리가 아니라 어딘가로 떠나는 싶어하는 구군가의 영혼의 음성이다.
만약에 내가 문학청년 시절에 이런 시를 읽었더라면 나의 시도 조금은 그 바탕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뒤늦게 해보기도 한다. (2010.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