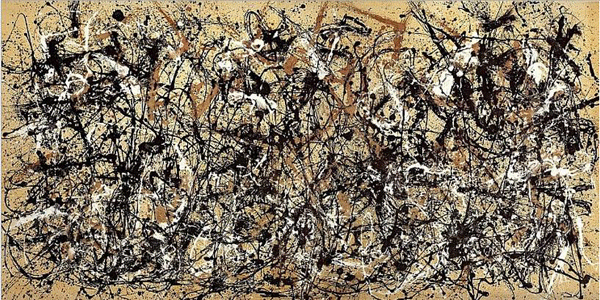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기세등등했던 초록의 세계는 하루하루 쌀쌀해지는 날씨에 힘이 빠져가고 있다. 초록은 붉은 색과 노랑, 갈색에 자리를 내주며 내년 봄을 기약한다. 마당을 점령했던 풀도 말 그대로 풀이 죽고, 산을 가득 메웠던 나뭇잎도 듬성듬성해지며 사이사이로 파란하늘을 보여준다.
붉은색 단풍은 잎 속에 있는 초록 엽록소가 줄어들고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 색소를 만들기 때문에 나타난다. 은행나무처럼 노랗게 물드는 것은 잎 속에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를, 갈색으로 물드는 참나무와 밤나무는 타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갈색으로 물드는 잎에도 카로티노이드가 있으며, 거기에 타닌과 안토시아닌을 각각 자신만의 비율로 만들어 여러 가지 색 조합을 나타낸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잎은 초록 속에 숨어있던 다양한 색으로 변신을 한다.
폴록의 <가을리듬>을 보면 갈색 흰색 검은색이 화면 위에 차례차례 드러나며 낙엽이 쌓인 숲길을 연상시킨다. 바쁘게 걸어가는 도시의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의 딱딱한 느낌이 아닌 매일 아침에 천천히 걷는 나만의 비밀스런 숲 길, 구불구불한 오솔길에 몇 해 동안 쌓인 낙엽이 발끝에 전해오는 부드러운 감촉의 숲길이 떠오른다. 거기에 낙엽이 바람에 구르는 것 같은〈고엽 Les Feuilles Mortes〉의 피아노 소리와 이브 몽탕의 감미로운 목소리까지 덤으로 들려준다.
폴록은 이젤과 캔버스대신에 바닥이나 벽에 천을 펼쳐놓고 그 위에 걸어 들어가 그림의 일부가 되어 작업을 했다. 붓은 화면에 닿지 않고 중력에 의해 물감이 떨어지거나 벽에 뿌려졌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옮겨 다니며 반복해서 물감을 쌓아 올린다. 화면에서 전후좌우의 구별이 사라지고 물감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물감은 나뭇잎이 되고 바람이 되고 별이 되고 피아노 선율이 된다.
아트센터 고마가 개관기념 특별전 ‘고마, 예술로 물들다 (다빈치에서 잭슨 폴록까지)를 전시중이다. 공주에서 폴록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가을의 행복이니 찾아가 보자. 도종환시인의 <단풍드는 날>을 소리 내서 읽어보고 욕심의 무게도 조금 가벼워지는 가을날이었으면 좋겠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放下着)
제가 키워 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단풍 드는 날,,, 도종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