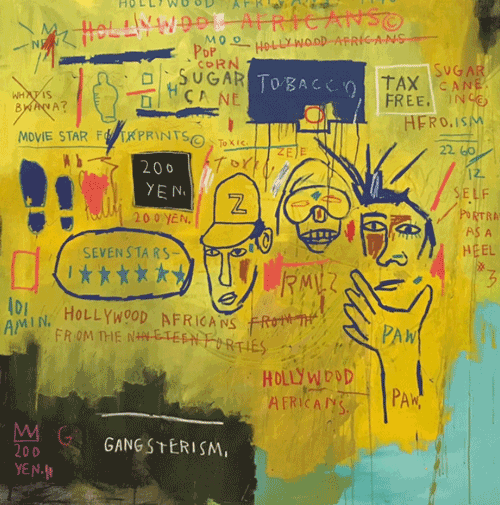
남북회담으로 시작한 대화가 북미 회담으로 물 흐르듯 흘러가고 가슴 먹먹하게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뉴스를 찾아 읽는다.
김정일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공동경비구역에서 선을 넘는 모습을 생중계로 바라본다. 카메라는 두 정상을 따라다니며 꼼꼼히 기록하고 보여준다.
잘 만든 디자인처럼 인공기와 성조기가 사이사이에 놓인 배경속에 북미 정상이 약간 긴장한 얼굴로 악수를 한다.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몇 달 사이에 다른 세상으로 온 듯하다. 북미 회담은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가졌고, 한 외신은 북한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묻는다.
인터뷰에 나온 사람들은 캐나다 북쪽 어디, 중동 지역, 아프리카 북쪽 등등으로 대답했다. 충격적이다. 올림픽, 월드컵, K팝, 삼성 등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여행 중에 아비뇽에서 만난 버스기사도 북한과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가 만난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했었다.
얼마전에 우리집에 왔던 우퍼(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부) 다니엘, 그의 부모는 아프리카 베냉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왔다고 했고 처음 듣는 나라였다. 토고 옆에 있다고 했고 토고는 들어 본 적이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어는 정도 인지도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한국과 베냉은 별로 다르지 않고, 관심 없는 그런 나라일 수 있다.
바스키아는 1960년 브루클린에서 아이티 출신 이민자 아버지와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어린 바스키아를 여러 미술관에 데리고 다니거나 몇 개의 외국어까지 가르쳤다고 한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업무로 자주 이사를 했고, 가출해서 공원에서 지내기도 하며 십 대 시절을 보낸다.
이후에 그가 예술가가 된 것은 아마 예술을 사랑한 어머니의 영향,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관에 간 기억 때문일 것이다. 거리에서 낙서, 그래피티로 시작해, ‘검은 피카소’나 ‘미국의 고흐’, ‘제임스 딘’으로 불리는 바스키아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채 십 년이 되지 않지만, 그동안에 삼천 여개의 페인팅과 드로잉 스케치를 남겼다.
그의 작품에는 그 자신의 이야기와 당시 미국의 사회상, 특히 인종차별이 주로 등장한다. 어린시절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가 준 책 '그레이의 해부학(Grey's Anatomy)', 그리고 당시 미국 사회에서 활약하던 흑인 등이 바로 그의 작품의 소재이다..
아프리카인이라는 유전적 뿌리, 흑인, 아시아인을 겨냥한 인종차별, 자유를 갈망하는 기질, 1980년대 미국의 자본주의 세태는 모두 작품의 소재이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폭력적인 사회, 죽음과 삶, 비극과 유머는 바스키아 예술의 중심이다.
이 소재들은 구급차나 비행기의 이미지 혹은 다양한 해부학도상으로 나타나고 인물은 형상이나 연관된 문구로 나타난다. 바스키아는 특정 아티스트를 향한 존경과 친애를 직접적으로 담았다. 이름을 명시하거나 그 아티스트의 창작물 제목을 적기도 하며, 왕관을 씌워주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색소폰 연주자 찰리파커 Charlie Parker, 권투선수 무하마디 알리 Muhammad Ali, 복싱선수 슈거 레이 로빈슨 sugar ray robinson 이 바로 그 대상이다. 이들과 바스키아의 공통점이자 연결고리는 바로 ‘흑인’ 이라는 것.
바스키아는 ‘나는 흑인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냥 아티스트다.’라고 말했다. 당시의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감이나 동시대 혹은 과거를 살았던 흑인 아티스트에 대한 연대의식과 존경심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기존의 미술 언어가 아닌 그만의 언어로 표현했다.
여전히 기울어져 있는 세계, 프랑스에서 온 아프리칸 다니엘,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예멘에서 살기위해 온 난민들, 언제쯤 평평해 질 수 있을까? 세계는 늘 기울어져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