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2천 년, 인물과 사건

이 글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금강 7-금강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2022.12.30. 간행)에 실린 글을 12회에 걸쳐 소개하는 것입니다.
6. 이곡, 백마강에서 백제를 회고하다
고려 이후 부여 백마강은 많은 선비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 답사지의 하나였다. 지금과 다른 것은, 지상의 백제 유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편을 이용한 백마강 답사였다는 점이다.
백마강 답사는 자온대, 부산(대재각), 낙화암, 고란사, 조룡대, 천정대 등 강변의 여러 명승을 구경하는 것이다. 부여박물관, 정림사지, 능산리왕릉, 나성, 궁남지를 들르는 지금의 답사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선비들이 부여와 백마강을 찾는 이러한 문화적 풍습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이후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한 암시를 주는 것이 13세기 말에 편찬된 일연의 '삼국유사'이다.
원래 경상도 출신인 일연은 충청도의 백제 땅은 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삼국유사에 부여 백마강의 명승들이 소개되어 있다.
정사암, 용암(龍巖, 조룡대), 부여 삼산(日山, 烏山, 浮山), 화돌석(火突石, 자온대), 대왕포(낙화암) 등이 그것이다. 이들 명승에 대하여 '삼국유사'(2, 기이2, 남부여 전백제)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사암: 나라에서 재상을 뽑으려 할 때 당선될 사람 3, 4명의 이름을 써서 함에 넣고 봉하여 바위 위에 놓아두고 얼마 후에 보고 이름 위에 인장 자국이 있는 자를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하였다.
용암(龍巖): 사비하의 강변에 바위 하나가 있다. 소정방이 일찍이 그 위에 앉아서 고기와 용을 낚아서 바위 위에 용이 꿇어앉은 자국이 있기 때문에 ‘용암’으로 이름하였다.
삼산(三山): 군 안에 3개의 산이 있어 일산(日山), 오산(烏山), 부산(浮山)이라 한다. 나라가 전성했을 때는 각각 신인이 그 위에 살면서 날아서 서로 왕래함이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았다.
화돌석(火突石): 사비하의 절벽에 또 돌 하나가 있어 10여 인이 앉을만하다. 백제 왕이 왕흥사에 가서 예불하려고 할 때는 먼저 이 돌에서 부처를 바라보고 절을 하였는데, 그 돌이 저절로 따뜻해졌으므로 화돌석(火突石)으로 이름하였다.
대왕포: 또 사비하의 양 절벽이 마치 그림 병풍과 같아서 백제왕이 매번 놀고 잔치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므로 지금도 대왕포라고 부른다.
한편 '삼국유사'(1, 기이1, 태종춘추공)에서는 '백제고기'를 인용하여 백마강의 낙화암이 이전에 ‘타사암(墮死巖)’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부여성 북쪽 모퉁이에 큰 바위가 아래로 강물에 닿아 있는데, 전해오는 말로는 의자왕과 모든 후궁이 함께 화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서로 이르기를, “차라리 자살할지라도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하고, 서로 이끌고 와서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고 하여 세상에서는 타사암(墮死巖)이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속설이 잘못된 것이다.
가정 이곡(李穀, 1298-1351)은 서천 한산인으로, 고향이 백마강에 가까운 곳이었다. 주행기(舟行記)는 이곡이 1349년(충정왕 1) 5월 16일 한산의 원산(圓山, 서천군 한산면)을 출발하여 3일간 1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과 선편으로 백마강을 답사한 것을 적은 것이다.
이 글에는 낙화암, 조룡대, 호암사, 천정대 등, 백마강의 명승중 네 곳이 언급되고 있다. 이곡이 소개한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가정집' 5, 舟行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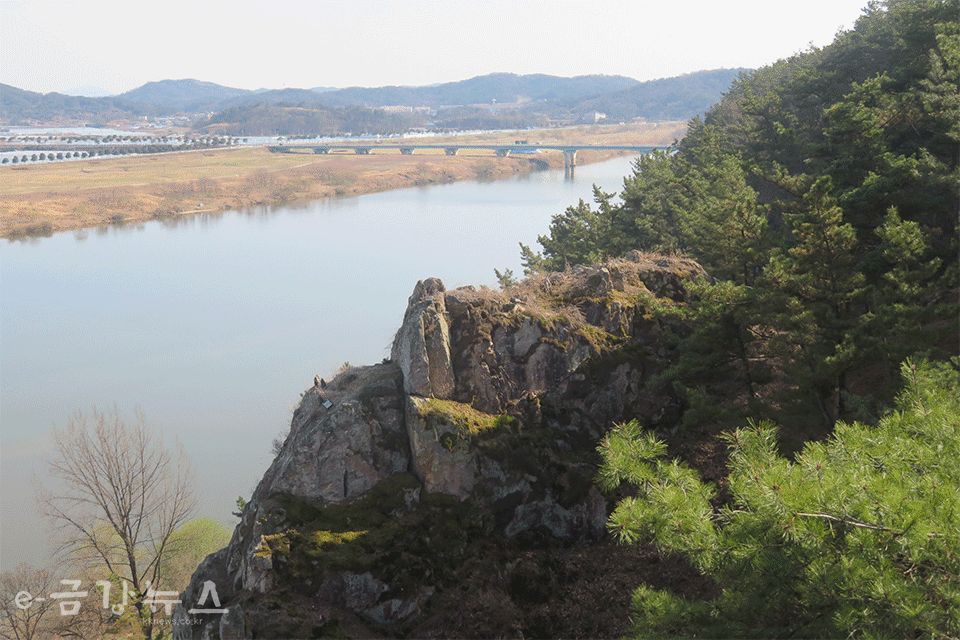
낙화암: 당시에 포위를 당하여 상황이 매우 급박해지자 군신이 궁녀들을 놔두고 도망쳤는데, 궁녀들이 의리상 당나라 군사들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여 떼를 지어 이 바위에 이르러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래서 낙화암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조룡대: 당나라 군사가 이곳에 와서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는데 강을 건너려고 하면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사방이 어두워져서 방향을 알 수가 없었다. 사람을 시켜 염탐하게 하였더니 용이 그 밑 굴속에 살면서 본국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당나라 사람이 술자(術者)의 계교를 써서 미끼를 던져 낚아 올리기로 하였는데, 용이 처음에는 저항하며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있는 힘을 다하여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바위가 갈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물가의 암석에서부터 그 바위 꼭대기까지 한 자 남짓 되는 깊이와 너비에 길이가 거의 한 길쯤 되는 파인 흔적이 마치 사람이 마치 일부러 깎아내어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일러 조룡대라 한다.
호암사: 조룡대로부터 서쪽으로 5리 쯤 가면 강 남쪽 언덕에 호암이라는 승사가 있다. 거기에 암석이 벽처럼 서있고 그 암석을 절이 등지고 있는데, 암석에 마치 바위를 타고 올라온 것 같은 호랑이의 발자국이 완연히 남아 있다.
천정대: 호암 서쪽에 1천 척 높이의 단애가 있는데, 그 꼭대기를 천정대라 부른다. 대개 이곳은 백제시대에 하늘과 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등용할 때면 언제나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이 천정대 위에 올려놓고는 군신이 조복 차림에 홀을 쥐고 북쪽 강안의 모래 톱 위에 줄지어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하늘이 그 이름 위에 낙점한 뒤에야 뽑아서 썼다고 한다.
이곡은 이상 백마강의 4개 명승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천리 길을 멀다고 하지 않고 이곳을 찾아오곤 한다”고 하였다. 제왕운기(帝王韻紀)의 저자 이승휴(李承休, 1224-1300)도 “안사(按使)로 나갔을 때 그곳(낙화암)에서 놀았다”고 하여 백마강에서의 선유(船遊) 경험을 언급한 바 있다. 13, 14세기 당시 이 백마강 코스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알려진 명승이었음을 전하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 이곡의 유람기를 통하여, 무엇보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고려 이래, 조선, 근대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1천 년 동안 부여는 선비들이 끊임없이 찾는 명승이었으며, 백마강은 그 가장 고전적인 답사지였다는 사실이다.
백마강에는 지금도 유람선과 수상 버스가 있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이곳이 가장 고전적 백제 답사의 명소라는 사실은 거의 잊혀진 것처럼 생각된다. 역사답사, 백제 학습의 현장으로서 백마강 답사의 회복과 재인식이 절실하다.

